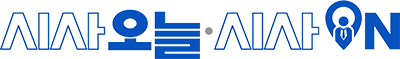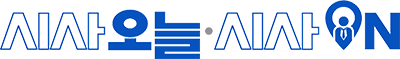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최근 항공기 엔진 결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차원의 MRO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중정비는 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마저도 기종별로 엔진 정비기술이 달라 대한항공도 일부 기종은 해외에서 엔진 중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해외 업체에 외주로 엔진 중정비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 지정 유일한 항공기 MRO 사업자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기체 중정비만 가능하고 엔진 중정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해외 MRO 의존도 개선을 위해 2018년 설립한 KAEMS의 LCC 정비 실적은 2021년 46대에서 2022년 40대, 2023년 22대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국 국내 항공사들은 엔진 중정비를 받기 위해 해외 업체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 예로, LCC의 국내 정비비 비중은 2019년 38.7%에서 2023년 28.9%로 감소한 반면 해외 정비비 비중은 2019년 62.2%에서 2023년 71.1%로 증가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2023년 18대, 2024년 14대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2대 이상의 엔진 중정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 1대당 100억 원 수준의 정비 비용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1200억 원 이상이 엔진 중정비에 쓰였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국내 MRO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MRO 산업 육성을 위해 엔진정비 원천기술 개발, 부품 업체 양성 및 배후 단지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