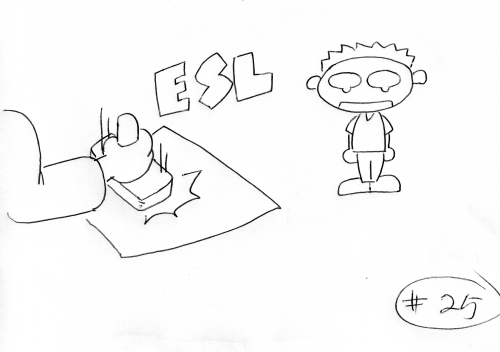"지금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 공부를 따라 갈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대답해 드린다.
"네. 공부 따라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 공부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미국 학생들과 쉽게 동화 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영어 발달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말한다.
"지금 미국 어디로 가든 한국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많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므로 최대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1997년 1월
유학을 가서 미국학생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말로만 듣던 유학이었다. 당시 압구정 바닥에는 '유학 붐'이 불어 너도나도 유학을 떠나던 시기였다. '도피성 유학'이라는 유행어가 생길정도로 한 학급에 1/3이상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빠져나갔다. 나 역시 이런 기류에 이끌려 16살의 나이로 유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었으나 이내 두려움이란 감정은 설렘,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American Dream'을 꿈꾸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미국 학생들과 어울려 놀며 당당하게 서있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
하지만 이런 내 'American Dream'은 학교를 입학한 첫 날부터 산산조각 났다. 기대감을 갖고 기숙사문을 여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기대했던 미국사람들은 안보이고 검은 머리의 아시아학생들만 눈에 띌 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방에서 여장을 풀고, 어머니와 누나를 보낸 뒤 우울한 마음으로 방에 누워있자 한국사람 한 명이 다가왔다.
"한국 사람이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나보다 세 살 많은 형이었다. 이 형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교 300명 학생 중, 한국 사람이 30명가량 되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 형을 따라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자 많은 한국 학생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사실 어머니와 누나와는 처음으로 이별을 해보는 것이라, 이런 한국 학생들이 나에게는 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전날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내 'American Dream'에 아직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도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다. 처음에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나를 끌고 간곳은 시험을 치루는 곳이었다. TOEFL을 치루고 525점을 넘어야지만 ESL Course(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기초 Course)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제외가 되면 ESL등록비용 250만원도 면제시켜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 살벌한 조건아래 잔득 긴장한 채 시험을 치렀으나 보기 좋게 낙방하고야 말았다. 미국에 처음 와서 맞본 최초의 좌절감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게 된 ESL Class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다. 미국 유학 오기 전에 TOEFL 공부를 미리 해놨던 터라 더욱 속이 쓰라렸다.
ESL반은 내 표현 방식으로 하면 'Disaster'였다. 온갖 선행학습을 섭렵한 나였기에 ESL반의 수준은 턱없이 낮았으며 동기 부여도 되지 않았다. 더 우울한 사실은 미국 애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7교시 중, 1~2교시밖에 되지 않았고 원어민들과 대화하는 빈도수보다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한국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미국인 친구를 꼭 만들고야 말거야.'
그때부터 피나는 노력이 시작됐다. 1~2시간 밖에 안 되는 시간을 최대한 살려 미국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공부를 많이 했던 나였지만 미국 아이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용기를 내어 영어로 말을 걸면, 미국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은 아예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런 취급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자신감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기엔 일렀다.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첫째, Listening문제가 있었다.
미국사람들 중에, 특히 10대들은 속어Slang를 입에 달고 다녔다. 또한 회화학원 선생님들처럼 또박또박 말을 씹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웅얼웅얼Mumbling 거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기들만의 Accent로 자기들 식의 영어를 쓰는 학생들의 말은 TOEFL Listening에 익숙해있던 나에게는 무척이나 버거웠다.
둘째,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어렵사리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다손 쳐도 그들이 무슨 주제를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 고학년 학생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대부분이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반년 전에는 〈1박2일〉이 대세였고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꽃보단 남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TV 쇼나 드라마에 대해서 무지하면 도무지 그들의 대화에 껴들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학생들도 똑같이 유행 아이템에 대해 서로 대화했다. 전날 보고 온 TV Show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여느 한국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절의 나로서는 미국 TV Show를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뿐더러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알아들어도 이해자체가 안됐고 웃음 포인트도 찾질 못했다.
이것은 3년 뒤, 미국인 친구들이 많아졌을 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였다. 아이들이 그들만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영락없는 '왕따'가 되곤 했었다. 그 시절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다. Bellamy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전형적인 '노력파'로서 새벽 5시에 몰래 공부하다가 우리들한테 발각되기도 했었다. 얼굴도 호감 형이 아닐뿐더러 영어 발음도 이상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었다. 하지만 Bellamy는 미국아이들 사이에서 만큼은 완벽하게 대화를 소화했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Bellamy의 남다른 노력 때문이었다. 내가 한국 학생들과 신나게 한국말하면서 놀 때 Bellamy는 미국인 친구와 영화관에 가서 그들 문화를 체험하고 영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또한 기숙사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TV Room에서 미국 TV Show를 보며 즐기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 전화해 '월드컵 축구예선 경기 한-일전' 녹화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할 때 Bellamy는 미국 스포츠의 꽃, Football을 즐겨보며 미국아이들과 같은 팀을 응원하곤 했다.
Bellamy와 나는 같은 미국 땅에서 이처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영어 노출빈도수가 많았던 Bellamy는 Listening과 Speaking Skill이 월등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로 미국 친구들이 많은 나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껴들 수가 있었다. 그들과 진정으로 '공감대Common Interest'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작 나는 그들 곁에서 겉돌고 있을 때에…….
To be continued…….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