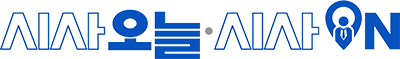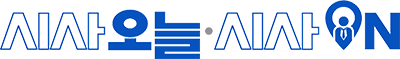“지금껏 자유의 해악 막을 방법으로 평등 이용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 보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인류와 생명 그리고 진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뜻을 지닌 이 단어들은 일반인들에게 있어 관심사로 자리잡기엔 무리가 있다. 하루 단위로 쏟아지는 경제나 산업 동향 등을 다룬 기사나 보고서와 달리 논문, 전문 도서 정도 돼야 접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누구나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관련 서적을 뒤져보지는 않았을지언정 생각 정도는 한 번쯤 해봤을 터다. 송만호 유미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나 생각은 해봤을 법한, 그러나 고민의 깊이가 깊지는 않았을 생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된 제109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송 이사장은 ‘사피엔스 역사의 통찰’을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생명의 시작은 세포막”이라며 강연의 첫 마디를 뗐다. 이어 생명을 세포막으로 인해 대사활동과 자가번식이 가능한 존재라고 정의하며, 이 중 세포막을 생명의 근원이자 ‘나’란 존재를 나타내주는 근거이자 이유라고 역설했다.
송 이사장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신화나 종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과학계에서는 약 38억 년 전 따뜻한 바닷물, 즉 새로운 영양분이 솟아오르는 해저 열수 공동체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액 세포가 38억 년에서 21억 년 전까지 진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약 17억 년을 버벅댄 셈이다. 이 기간을 ‘희생 기간’이라 한다”며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난 뒤 희생기간을 지나고 나니 지구 환경이 바뀌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산소와 진핵세포. 송 이사장은 이 두가지가 17억 년의 희생 기간 동안 가장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세포가 진화하는 과정을 짚었다. 그는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의 약 100만 배 정도로 체적이 커졌다. 최초의 다세포를 해면이라고 한다. 원핵세포가 모래라면, 진핵세포는 보도블록이고, 다세포는 건물”이라며 “지구에는 아주 큰 빙하기가 지구를 두 번 덮쳤고, 23억 년 전쯤 1차 빙하기를 거치면서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8억 년 전 2차 빙하기를 거쳐 다세포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했다.
“생물은 무엇이든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생물은 무엇을 먹고사는 것 같은가. 아니 애초에 생물은 무엇일까?”
세포에 대해 설명하던 송 이사장이 청중들을 향해 갑작스레 물었다.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자생하는 독립영양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말을 듣고 나서야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는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얼마나 뚱뚱한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나 나무는 또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 중요한건 결국 유전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먹고사는 방식이 다를지언정 결국 앞서 설명한 세포와 동·식물이나 똑같은 생물이라는 점에서 유전자적 차이 외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다.
송 이사장은 “찰스 다윈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진화”라며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고, 개체군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진화가 일어난다. 현재 지구상에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식의 진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람이 알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진화의 속도가 몇십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재변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느릴 것이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송 이사장은 또 한번 청중들에 되물었다. 생명은 평등한 것이 맞는지, 만약 평등하다면 왜 불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잠깐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송 이사장은 말을 이어갔다.
그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기본 분자나 작동원리가 사람, 동물, 식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란시스 크릭의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해당 자료에는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의 순서로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평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결국 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라는 질문을 건네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잘못됐다. 앞서 설명한 평등의 이야기는 생명이 유지 및 전달되는 기본 원리가 평등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소위 역사 시대 동안 인간이 평등한 적은 없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으며, 어떻게 일반 백성과 왕이 평등하겠는가. 최소한 평등은 투표 정도를 입에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대체 평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쥘 수 있는 것일까. 송 이사장은 평등이라는 ‘파랑새’를 찾겠다는 정치적 탐사를 그만두고, 그 대안을 찾아봐야 할 때라면서 속시원한 답을 전해주지는 않았다. 아니 애초에 평등을 정의하지조차 않았다. 대신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약자에 대한 마음이나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이 움직일 때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자유의 해악을 막을 방법으로 평등을 이용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 보면 어떨까. 많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도모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박애지향적 세제를 가미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