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아버지’ 에 대한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원재 기자]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화상을 그린 책이다. 저자 윤문원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아버지와 자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눈을 가진 사람.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인 사람. 그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 책은 ‘아버지’로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는 감정과 자식이 성장하면서 보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이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과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행동을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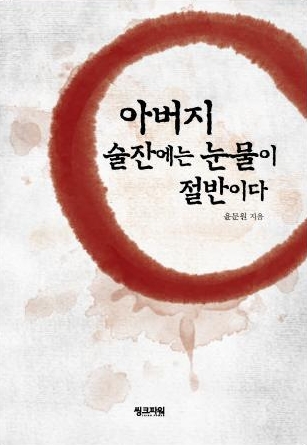
상징적인 비유 때문에 어머니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심중에 고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얼굴로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보다 아버지의 눈물은 그 농도가 열 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깨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보여주기 싫어한다. 그 결과 아버지의 이마에 하나 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고 아버지의 꾸부정해진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이다.
저자는 아버지를 말할 때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삶의 전부가 되면서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오히려 술 한잔으로 호기를 부리기도 한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해 하거나 자신만만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삼킨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 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자식들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 최고 기대는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저자는 또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말은 씨가 되어 자식의 꿈이 되고 삶이 된다.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방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자식의 힘이고 자식은 아버지의 힘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성공한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이다.
아버지! 그는 고향 뒷동산의 바위 같은 존재다. “시골마을의 느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존재,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자욱한 안개와도 같은 그리움의 존재”라고 저자는 말한다.

